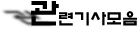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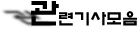
| 
|
인기드라마<그대 그리고 나>의 작가 김정수씨(48). 그는 79년 단막극 <구석진 자리>로 방송에 입문하면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20년 가까이 살아왔다. 그런 김정수씨가 넉달째 이웃들과 얼굴 한번 마주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MBC TV 주말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두문불출이다. 시간에 쫓겨 좀처럼 집 밖 외출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12년간 <전원일기>를 써왔던 중견작가 김정수씨지만 이렇게 시끌벅적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다. 화제의 작가 김정수씨를 만나본다. - 시청률 40%면 근래 보기 드물게 높은 기록인데.
▲ 시청자들께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시청률이 높을수록 부담감만 커진다. 소심한 성격은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원고도 잘 써지지 않는다. 요새는 썼다가 지우는게 일과가 되버렸다.- <그대 그리고 나>의 드라마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점은.
▲ 젊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고자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아무 부족함 없이 자라 결혼에 대한 생각도 거의 유치원생 수준이다. 결혼은 사랑하는 남자만을 선택하는 것이고 시댁식구의 '시'자도 생각지 않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다.- 요사이 방송되는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주제가 잘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인데.
▲ 시끄러운 박재천(최불암)일가의 이야기가 방사형으로 뻗어 나갔기 때문이다. 드라마가 생물같아서 쓰면서도 작가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 드라마가 끝난게 아니니 좀더 두고 봐달라.- 그렇다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떤 방향인가.
▲ 1회부터 8회까지 수경(최진실)과 동규(박상원)이야기가 중심이었듯이 51회부터 58회 최종회까지는 이들 젊은부부의 이야기로 막을 내릴 생각이다. 결국엔 수경이 '여편네'가 돼가는 모습으로 끝맺지 않겠는가.- 박재천과 홍여사(박원숙)의 로맨스 그레이가 화제다. 엔딩부분을 기대해도 좋은가.
▲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한다니 더욱 망설여진다. 하지만 박재천과 홍여사의 로맨스는 이쯤에서 끝맺는 게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막내아들 민규(송승헌)의 생모 때문인가.
▲ 한국적 상황에서 박재천에게 계순(이경진)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 내 생각에도 역시 남자가 책임지는게 당연하지 않나 싶다. 하지만 계순쪽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부호로 남겨두고 싶다.- 최불암의 변신도 많은 재미를 주었다. 처음엔 최불암이 출연하지 않으려고 했다던데.
▲ 뻥도 심하고 체면 구기기 십상인 역이라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최불암씨면 잘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직접 설득했다. 최불암시리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전원일기>의 김회장을 너무 정형화된 인물로 그려낸것이 아닌가 싶어 변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너무 잘해줘서 정말 기쁘다.- 젊은 세대의 모습을 묘사하는데도 상당히 실제에 근접해있다는 평이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
▲ 22살짜리 딸애와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의 도움이 컸다. 아이들이 쓰는 말, 즐겨입는 옷, 좋아하는 음악 등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느낌이다. 송승헌을 막내 민규역으로 점찍을 수 있었던 것도 딸애가 보여준 스톰모델 사진을 보고서였으니 톡톡히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가족 얘기가 나왔는데, 좀더 자세히 말해달라.
▲ 목포대 국문과 교수인 남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남편이 7살 연상인데다 주말부부라 부부싸움하기도 어렵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에 다니고 있다. 글을 쓴답시고 가족들을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할 때가 많다.- 작가로서 어려운 점은.
▲ 갈수록 글이 안써지는게 역시 제일 고민이다. 마감시간에 쫓겨 팩스로 대본을 보내는 때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체력적으로도 작가는 힘든 직업임에 틀림없다. 하루종일 컴퓨터와 씨름하고나면 근육통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을 지경이다. 요즘은 눈물이 나오지 않는 안구건조증으로 인조누액을 손에 달고 사는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다시한번 <그대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밝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수경과 동규, 영규, 아버지 그리고 민규처럼 말이다.
- 1998년 3월 1일 일간스포츠 임영준기자 -